운전, 일상이 되다
자동차의 탄생과 대중화
우리는 인생에서 대부분 정해진 경로에 올라탈 뿐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 달리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자동차에 오르면 뭔가 능동적으로 내 삶을 움직인다는 기분이 든다.
글. 이상우(문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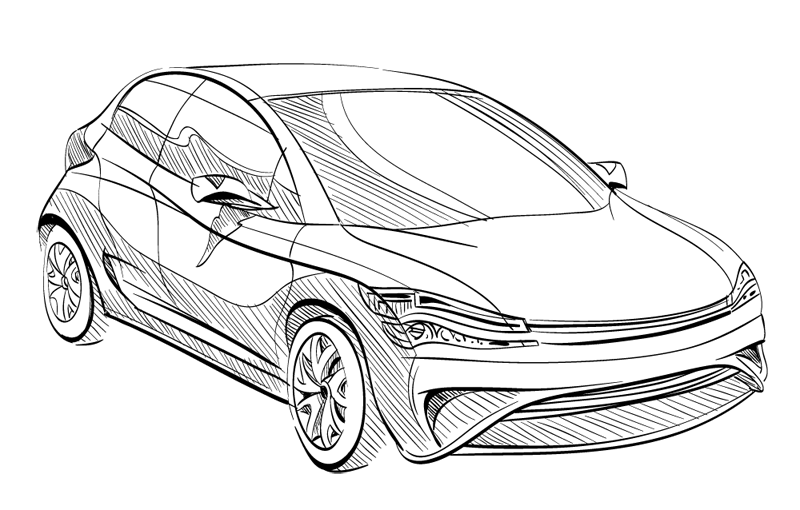
769년 프랑스의 퀴뇨는 와트의 증기기관을 보고, 이를 이용한 증기 자동차를 발명했다. 최초의 증기자동차는 앞쪽에 거대한 보일러가 있었고, 브레이크가 없어서 운전하기 매우 어려웠다. 실제로 테스트 중에 돌벽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는 인류 최초의 자동차 교통사고였다. 증기자동차는 한때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을 벌이기도 했으나, 무거운 무게와 폭발 위험성으로 인해 점차 도태되었다.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내연기관이 발명된 이후부 터였다. 내연기관과 자동차를 연결한 인물은 독일의 다임러였다. 그는 완벽한 엔진을 개발하고자 동료 마이바흐와 함께 독자적인 내연 기관 제작소를 차렸고, 직접 만든 내연기관을 이동수단에 접목시켰 다. 두 사람은 1885년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최초의 모터사이클 ‘라이트바겐’을 개발했으며, 4년 뒤 마침내 내연기관을 장착한 4륜 자동차를 만들었다. 하지만 다임러의 자동차가 최초의 자동차는 아니 었다. 카를 벤츠는 이미 1885년 석탄가스로 움직이는 3륜 자동차를 개발했고, 이듬해 특허를 받았다. 벤츠는 자동차를 일반인들에게 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가속페달, 점화플러그, 클러치 등 오늘날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했다. 그리고 1894년에는 세계 최초의 양산 자동차 ‘벨로’를 선보였다. 한편 다임러와 벤츠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1926년 서로 손을 잡고 자동차 업계를 선도해 나갔다. 다임러의 브랜드 메르세데 스에 벤츠를 더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오늘날 자동차로 이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벤츠와 다임러 같은 선구자들 덕분이다. 허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헨리 포드 때문이다. 초기의 자동차는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비쌌고, 일부 부자들만 구입할 수 있었다. 포드는 이런 자동차 산업에 대량생산 시스템을 적용해서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포드의 ‘모델T’는 자동차 산업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전의 자동차들은 소규모 수공업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고객이 차량을 주문하면 그 요구에 맞게 제조되었고, 부품의 규격이나 조립과정도 모두 제각각이었다. 포드는 이 모든 과정을 단순화시켰다. 그가 도입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자동차 산업은 물론 수많은 제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노동자들이 조립 라인에서 단순한 작업만 반복하면 자동차가 만들어졌고, 단순 노동의 속도가 곧 생산 속도로 이어졌다. 포드는 노동자들에게 많은 임금을 주면서 이직률을 낮추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했다. 특히 모든 작업 동작을 초 단위로 관리하는 테일러주의는 컨베이어 벨트와 결합하면서 엄청난 화학반응을 일으켰다. 포드는 1908년 8월에 최초의 모델T 를 출시했다. 첫 달에 완성된 수량은 단 11대. 하지만 1913년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면서 이듬해 일일 생산량 1,000대를 기록했고, 이후 생산량이 빠르게 늘면서 연간생산량 100만 대를 돌파했다.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자동차는 이렇게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었다.
- 운전과 길의 재구성
모델T를 구입한 대중들은 이것을 주로 출퇴근에 활용했다. 바야흐로 자동차 통근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언 게이틀리의 『출퇴근의 역사』에 따르면 1920년 무렵 자동차 소유주의 90%는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였으며, 주행 거리의 60%가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모델T는 승차감이 좋지 않았고 속도도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자동차는 통제된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부터 운전자들을 해방시켰다.
오늘날에도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다.
자신을 둘러싼 공간이 변하기 때문이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모든 길은 언제든 내가 갈 수 있는 길,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운전을 하면 길을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 버스나 택시를 탈 때는 그저 구경꾼이다. 운전자가 다 알아서 해주니 도로 상태나 경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직접 운전을 하면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다. 도로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주변의 차들을 살피는 한편, 목적지까지의 경로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인생 에서 대부분 정해진 경로에 올라탈 뿐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 달리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자동차에 오르면 뭔가 능동적으로 내 삶을 움직 인다는 기분이 든다. 어쩌면 자동차의 엔진소리는 지금껏 다니던 길이 해체되고 새롭게 재구성되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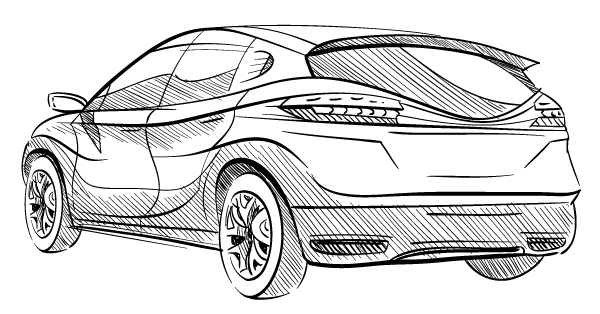
※ 이 글은 『얄팍한 교통인문학 : 당신이 궁금했던 탈것의 역사와 문화』 (크레파스북) 중에서 일부 내용을 축약해 수록하였습니다.









